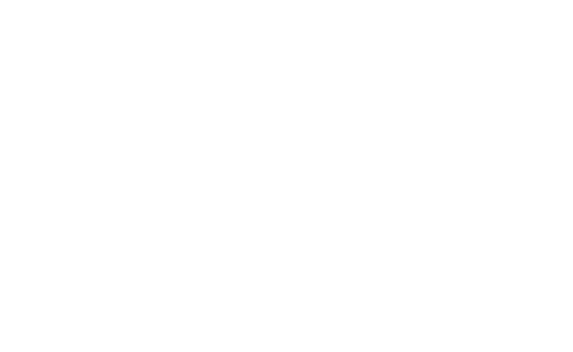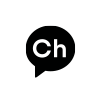행복 채우고
인문을 7해
나를 되돌아보며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곳,
동명면 억새마을

동명면은 칠곡군의 근간이라 말할 수 있는 칠곡도호부가 자리했던 가산산성과 천년고찰인 송림사가 자리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야간 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인근 주민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 동명저수지도 있지요. 무엇보다 종교를 떠나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을, 동명면은 품고 있습니다.

‘한티가는 길’의 종착지
한국의 ‘산티아고 길’이라 불리는 ‘한티가는 길’은 칠곡군 왜관읍 가실성당에서 신나무골성지를 거쳐 팔공산 한티순교성지까지 45.6㎞의 아름다운 숲길과 산길을 걷는 5개의 도보 순례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개의 구간은 각각 돌아보는 길, 비우는 길, 뉘우치는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로 불리는데, 마지막 사랑의 길 구간 그 끝자락에 한티 억새마을은 자리하고 있지요.
동명면 팔공산 기슭으로 들어서면 보이는 동명저수지를 거쳐 드라이브하기 좋은 한티 셰프의 산책길을 따라 가산산성 야영장을 지나쳐 굽이굽이 굴곡진 고개를 오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한티 억새마을입니다. 한티 억새마을을 향해 가는 길 자체가 아름다워서일까요?
가는 내내 잠시 차를 멈추고 사진을 찍는 이, 늦가을을 만끽하려는 듯 오토바이로 길을 오르는 라이더들, 한티 셰프의 산책길에 자리한 식당에서 고즈넉한 휴식을 즐기는 이들을 쉼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티 억새마을은 칠곡군에서 군위군으로 넘어가는 한티재 아래에 위치한 보물 같은 명소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를 피해 신자들이 모여 살던 억새초가 마을을 복원한 곳입니다. 마을이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우리가 아는 그 마을은 아닌 셈이지요.
현존 국내 유일 억새초가 군락지
칠곡군에 따르면 팔공산 중턱 해발 600m 구릉지 약 3만5천㎡에 위치한 한티 억새마을은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억새초가 군락지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억새초가는 약 200년 전부터 여기서 생활해 오던 선조들의 전통적인 주택양식이었죠.
깊은 산속 분지처럼 자리했기 때문일까요. 마을의 가옥 형태는 모두 억새초가입니다. 산 능선 등 고지대에서 자라는 억새는 흙과 함께 이곳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지붕재료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볏짚을 엮어 지붕으로 만든 초가와 달리 억새로 지붕을 덮으면 매년 이엉이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볏짚에 비해 억새는 수분 흡수율이 낮아 1년 단위로 교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천연 향균 물질이 들어 있어 잘 썩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억새 이엉으로 지붕에 두텁게 층을 쌓으면 보온 및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지요. 깊은 산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집이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티 억새마을은 당시 산촌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 짚이나 억새, 산죽 등으로 엮어 만든 지붕재료, 또는 그 지붕을 교체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슬픔을 간직한 억새초가
이 깊은 산 중턱,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산 정약용이 처음 학문으로 받아들였던 천주교는 조선시대인 1800년대 초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며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유교 사회에서 제사를 거부하는 천주교는 탐탁지 않은 종교였죠. 그리하여 온갖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한티 억새마을은 박해를 피해 한두 명씩 숨어든 신자들과 박해로 대구 감형에 갇힌 신자들의 옥바라지를 위해 모인 가족들로 이뤄진 마을입니다. 1860년 경신박해 이후 마을은 커져 갔지만 병인박해(1866년)가 이어지던 1868년 늦봄, 불행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포졸들이 와서 신자들을 처형하고 그들이 되돌아와서 살지 못하도록 마을 전체를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그때 마을 위치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본래는 한티 순교 성지 순교자 묘역의 대형 십자가 뒤편이었죠. 현재 한티 억새마을은 그때 살아남아 흩어졌던 신자들이 다시 새로운 터에 만들었던 마을을 복원한 겁니다. 잊혀 버린 줄 알았던 이 마을은 1980년대 초 대구대교구가 한국천주교 창립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성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억새는 모든 걸 다 보았을까
마을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전형적인 60~70년대 산골 마을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뛰어놀며 웃음 짓는 아이들과 우물에서 물을 떠오는 아낙을 만날 것만 같습니다. 참담함 속에서도 오로지 신앙이라는 정신 유산으로 위로와 평화를 받으며 버텼을 이름 모를 누군가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비어있는 줄만 알았던 억새초가 지붕 위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물어보니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져 버리고 마는 초가의 특성상 천주교 신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조를 짜 억새초가 아궁이에 매일 잊지 않고 불을 지핀다고 합니다. 12채 가운데 7채는 피정의 집으로 쓰이기 때문에 관리는 필수랍니다.
한티순교성지, 한티마을사람, 숯가마터 등을 포함해 천주교 신자들에게 성스럽고 자랑스런 공간으로 알려진 이곳이지만, 일반인들에게 가을 명소로 더 유명합니다. 한티 억새마을을 에워싼 너른 억새 군락지 때문이죠.
가을의 정점에 방문해서였을까요. 바람결에 ‘사르르’ 고개 숙인 억새들이 만들어낸 장관에 이내 감탄하고 맙니다. 은빛 억새 물결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처형당했던 안타까운 생명들, 이곳에 터를 잡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 다부동 전투가 치열했던 6·25전쟁 당시 겪었던 민족상잔의 아픔까지…. 억새들은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보았겠지요. 2m를 훌쩍 넘긴 키다리 억새들이 만든 아름다움이 황홀하면서도 처연합니다. 또 다른 바람결에 고개 숙였던 억새들이 ‘사르르’하고 다시 허리를 폅니다.
고요하게 걸으며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안성맞춤인 곳, 이곳은 한티 억새마을입니다.